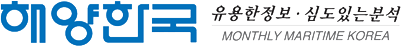“현재 한국해운호가 직면한 상황은 기업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는
리스크risk가 아니라 정부에서 대처해야 할 위기crisis로 인식해야 한다”
관리단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비경제선의 처분이라는 이름하에 선박 등 회사자산은 사실상 떨이수준에서 정리되었다. 당시 경영층에서는 관리단이 회사의 갱생을 지원하기 위해 온 것으로 이해할 만큼 상황인식이 안이했지만 기대가 허황된 것임을 파악하였을 때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관리단이 들어온지 한달만에 KSC 임원 22명중 16명을 해임하고 관리단은 회사를 완전히 장악했다. 양대 간판선사의 경영권이 은행으로 넘어간 것이다. KSC의 경우 일차 작업이 마무리되자 이번에는 회사의 실상 확인을 이유로 인수 후보사로부터 대규모 실사단이 들어오면서 윗층에는 은행관리단이 아랫층에는 인수사측 실사단이 상주하는 체제가 한동안 지속되었다. 주무관청의 중재하에 관리단과 실사단 간에 정해진 시나리오와 절차가 진행된 후 양측 간에 합의 조정된 부채 총액 가운데 일정 부분은 탕감해주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00년 거치 00년 분활상환이라는 패키지를 붙혀서 문패가 바뀌었다.
당시 국제해운계에서는 1984년 정부에 의한 해운산업합리화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평가하였는가 하면, 국내에서도 정부가 괴물들을 합해서 또 다른 괴물을 만들었다고 비판할 정도였다. 여기서 거대괴물이란 1970년대 후반 정부가 부적절한 시기에 주도했던 해운산업 확대프로그램을 지칭하는 것이다. 시기적으로 부적절했던 선복확대정책이후 해운시황의 침체로 선가는 반토막이 났고 운임이 1/3수준으로 하락하자 시장 여건에 맞지 않은 비경제선박을 너무 많이 보유한 사실을 깨달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이상 Lloyd’s List Nov 11. 1986). 그래도 당시에는 용선료 등 해외부채가 없었고 문제기업의 규모도 아담하였을 뿐 아니라 ‘산업정책 합리화자금’이라는 당근과 채찍도 있었기에 정부 주도하에 급한 불은 끌 수 있었고 벼랑 끝에 서있었던 양대선사는 문패가 바뀌었지만 갱생에 성공했다.
최근 상황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한국의 양대 간판회사가 국내채권단, 해외용선선주를 상대로 채무상환연기와 용선료 하향조정, 조기반선 등을 두고 협상이 진행 중이나 내용을 보면 2009년 국내 K사가 외국선주를 상대로 시도했던 협상을 다시 반복하고 있다. K사의 경우처럼 이번에도 외국선주들은 한국회사들은 조용히 있다가 어느 날 소리없이 법원으로 간다며 비판을 한다. 설상가상으로 용선선주들이 한국선사를 상대로 용선료를 할인해주면 유럽의 대형 컨선사들이 자신들의 용선료도 깎아주어야 한다(Me too!)고 선주를 압박하며 사실상 협상을 방해하고 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최근 일본의 한 선사가 재정란에 허덕이고 있는 Daiichi Chuo의 예를 들면서 그들은 회사의 사정을 사전에 설명해주고 대책을 함께 협의하다가 그래도 대책이 없으면 법원의 문을 두드리는데 다른 회사는 투자자가 돈을 회수해가고 시장이 어렵다는 말만 하다가, 자기들은 준비자세가 전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배수진을 치고 협상을 요구한다며 못 마땅해 한다. 이런 반복된 관행이 결국 일본해운계, 특히 은행들로 하여금 상대국 해운계를 경계토록 한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최근 여러선사들이 법정관리행을 택하고 있다. 나름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겠지만 이러다간 한국해운에 대한 Counter-party risk 문제가 해외에서 거론될 가능성이 우려된다.
최근 해외에서는 현 침체를 완화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은 선사들의 통합뿐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 양대선사를 통합한 National champion은 고사하고 국적 간판선사들의 위상이 통째 흔들리는 것 아닌가 우려될 정도로 상황이 매우 심각해 보인다. 30년전에는 해운업계 뿐이었는데 이번에는 조선산업과 동반 하락하다보니 정부의 고민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외신에 의하면 모 그룹에게 DSME를 인수토록 권고하고 있다고 한다. 조선분야의 Big 3가 동시에 존속하려면 2000년 중반의 호황이 되돌아 오거나 다시 고유가 시대가 되어 Offshore 부분이 되살아나야 하는데 그 가능성은 멀어보인다.
개별회사의 능력이나 정부의 대응을 살펴볼 때 한국해운호는 초대형 허리케인을 앞에 두고 있다. 일시 위기를 면하더라도 연이은 법원행으로 대외신뢰도가 실추되면 이는 두고 두고 부담으로 남을 것이다. 정상화는 곧 경쟁력의 회복을 의미하며 현 컨테이너 시장의 구조상 얼라이언스 참여는 생존의 전제조건이다. 4대 얼라이언스의 재편은 이미 가시화 되어있고 현 침체 시황에 비추어 볼 때 재편의 중요 변수는 ULCs의 기여능력보다는 Counter-party risk가 될 것 같다. 해외시각에서 한국의 양대선사를 어떻게 생각할지 역지사지의 자세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국적 원양 컨테이너선사의 장래가 불투명해지고 한국해운의 뿌리가 흔들린다면 이는 개별기업이 아니라 한국해운에 관한 문제이며 곧 정부당국의 정책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최근 싱가폴 정부가 국영선사인 NOL을 포기한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 우려스러운 사태가 벌어진 다음 주무부처에게 집중될 ‘눈’을 생각해봐야 한다. 당근도 채찍도 없기 때문에, 개별기업의 규모가 이제는 더 이상 핸디 싸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에 한계가 있는 것도 현실일지 모른다.
글로벌 해운시장의 침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한국 해운기업의 취약한 재무구조 또한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불과 60년 안팎의 한국해운사를 되돌이켜 보면 한국해운계의 부침은 일정간격을 두고 반복되어왔으며 외국 어느 나라보다 기복의 정도가 특히 심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호황이 오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감에서 벗어나야 한다. 일각에서는 Dry Bulker 부문은 예측 자체가 어렵고 예상과 달리 회복이 빠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컨테이너분야마저 향후 4년은 더 기다려야 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해운을 싸이클 산업이라고 하지만 이번의 경우는 단순한 주기가 아니라 지난 7년의 불황에 이어 터널의 끝이 아직도 보이지 않을 만큼 Super Cycle이다. 현재 한국해운호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은 기업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는 리스크risk가 아니라 정부에서 대처해야 할 위기crisis로 인식해야 한다. 1961년 미국방장관 맥나마라씨는 위기는 예방되는 것이 아니라 관리되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차원의 위기관리 대책과 함께 한국해운의 취약점에 대해 근본원인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이유다.
- 기자명 윤민현
- 입력 2016.05.02 11:24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