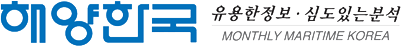나는 처음 엔진을 접했을 때 저것이 어떻게 해서 돌아갈까 하고 참 궁금했었다. 처음으로 엔진을 발명한 기사들이 참 위대해 보였다. 그들은 보자기를 이리 접었다 저리 폈다가 하다가 하얀 비둘기를 포르르 날려내는 마술사 같은 사람들이었을까. 그래서 쇳조각들을 이리저리 붙여놓고, 얏!하고 기합을 불어넣어 그것이 돌아가게 했을까. 아니면 흙으로 사람을 빚어놓고 생명을 불어넣은 창세기의 하느님처럼 그렇게 기운을 불어넣었을까. 생각을 가다듬고 차근차근 작동의 근원으로 찾아가 보았다. 스크루에서 시작하여 힘이 나오는 곳으로 거슬러 따라가 보면, 먼저 샤프트가 있고, 샤프트는 크랭크에 의해서 돌아간다. 크랭크는 연접봉에 의해서 돌아가고 연접봉은 피스톤에 의해서 돌아간다. 그 다음 피스톤은 무엇에 의해 움직이는가 하는 데에 이르면 헷갈리곤 했다. 연소실에 기름이 들어가서 폭발을 하여 피스톤을 밀어낸다고 하는데, 그 연소실에 무엇이 있어서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일까 알 수가 없었던 것이다.
선배들에게 그 속에 뭐가 있냐고 물어보면 “있긴 뭐가 있어? 아무 것도 없지!”라고들 했다. 그러나 나는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 더욱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 속에 오묘한 무엇이 있지 않고서야 어찌 그런 큰 힘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 싶었다. 실린더카버를 열면 꼭 확인을 하리라고 다짐을 했다. 마침내 그것을 여는 날이 왔다. 열고 보니 그 속에는 정말로 아무 것도 없었다. 허망할 정도로 텅 비어 있었다.
“정말, 아무 것도 없군요.”
나는 새삼 놀라면서 선배에게 말했다. 그러자 그가 말했다.
“없기는 왜 없어! 공기가 있잖아! 열이 가해지면 늘어나는 공기 말이다. 그 속에 산소가 있어서 기름이 타서 가스가 되게 하고, 그 연소열에 의해 그 가스는 온도가 올라감으로 팽창하여 그 힘이 피스톤을 밀어내잖아.”
나는 한참 동안 멍해 있어야 했다. 그러다 문득 책에서 배운 이론들과 엔진의 실제 작동 과정이 쫙 꿰어지면서 머리가 환히 뚫리는 것이었다.
“밀폐된 공간에 공기를 넣고 압축을 가하면 압력과 온도가 올라간다. 여기에 연료를 주입하면 연소가 일어나 가스가 팽창하여 피스톤을 밀어낸다.”
기름의 탄소가 연소실로 들어와서 이미 들어와 있던 공기 중의 산소와 섞여서 연소하여 CO2 가스가 된다. 같은 중량의 탄소가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니 그 부피가 급팽창한다. 이 가스는 또 기름이 가진 열량만큼 온도가 올라감으로써 팽창을 한다. 1도 올라가는데 273분의 1배씩 늘어나 273도가 올라가면 두 배로 늘어나고 2,730도가 올라가면 열배로 팽창한다. 그것이 순식간에 일어나니 폭발이 되어서 그 힘이 피스톤을 밀어내는 것이다.
모든 것을 다 안 듯이 의기양양 돌아서는데, 또 다른 의문이 생겼다. 공기가 어떻게 그런 작용을 하는가 싶었던 것이다. 공중에 꽉 차 있는 공기, 우리가 숨 쉬는 이 공기, 만져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이 공기가 어째서 누르면 압력과 열이 생길까? 혹시 디젤엔진을 발명한 ‘루돌프 디젤’이 그렇게 만들었나? 아니다. 아득한 태고, 사람이 이 세상에 출현하기 전에도 공기는 있었고, 이런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그는 그러한 자연의 성질을 발견하고 그것을 응용하여 기관을 만들었던 것이다.
내연기관만 그런 것이 아니다. 외연기관은 액체가 가열되면 증기가 되어 팽창하는 성질을 이용하여 기계를 돌리는 것이다. 전기는 세상에 불을 밝히고, 기계를 제어하고, 에너지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동력의 형태를 변환시켜주는 현대 문명의 꽃이다. 이 전기도 미묘하고 아주 작아 보이는 어떤 법칙에 의해서 발생한다. 자석의 자기(磁氣)의 흐름을 쇠막대기 등으로 끊으면 그 막대기에 전기가 일어나는 성질이 자연 속에 있는 것이다. 기계만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 배가 물 위에 뜨는 것은 비중차이 만큼 뜬다는 부력의 법칙에 의한 것이고, 우리가 지구의 표면에 붙어서 살 수 있는 것은 지구의 중심으로 향한 중력의 법칙 때문이다.
그런 물리 세계를 벗어나 세상 일반으로 시야를 넓혀봐도 그렇다. 꽃이 피고 지고, 낮이 오고 밤이 오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순환하는 것도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그렇다. 사람이 모이고 흩어지고 발전하고 쇠퇴하는 사회현상도 그 이면에는 사화와 역사의 발전 이론이 있다. 그러면 지구를 차지하고 우주까지 정복하려는 우리 위대한 인간들은 어떨까. 우리는 우리 맘대로 행동하고 살아간다고 여기지만, 사회적으로는 우리의 행동들을 제어하는 규범들이 있고, 내적으로는 심리작용의 이치에 의해서 행동하고 말한다. 그러고 보면 삼라의 모든 사물이나 존재가 어떤 법칙성에 의해 존재한다. 시골 하천 위의 작은 다리 하나도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철근과 시멘트에 의해서 지탱되고 있지만, 기술자의 눈에는 교각의 각도와 판의 강도 등 역학적 법칙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천체 물리학자들이 우주 현상들의 근원을 밝혀내는 과정을 살펴보면 우주는 참으로 법칙이 지배하는 세계가 아닐 수 없다. 거시적 우주에서부터 은하들과 별들과 원자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물리법칙이 얼마나 정밀하고 엄격하고 절대적으로 작용하고 있는가에 새삼 감탄하게 된다.
이렇게 각각의 사물에 내재하는 다양한 이법들에 의해서 내가 존재하고 세상이 돌아가고 우주가 운행된다면, 그 많은 법들을 있게 하는 큰 법이 없을까. 그 가지들의 줄기가 되고 뿌리가 되는 큰 법칙 말이다. 그런 것이 있을 것 같고, 그와 소통을 하고 싶어진다. 삼라의 모든 현상들의 이면에 있는 지엽적 법칙들과 더불어, 그 본 줄기 혹은 그 뿌리와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문득 뒤가 든든해진다. 대통령이 우리 아버지라도 되는 듯하다. 나는 흩날리는 낙엽 같은 존재가 아니다. 기댈 언덕이 없는 고아가 아니다. 세상을 등지고 망망한 바다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거미줄처럼 법칙의 망으로 짜여진 우주 유기체의 일부로서 서로서로 단단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오늘도 우리 엔진은 우렁우렁 돌고, 배는 오대양 육대주를 넘나든다. 이 세계를 구축하는 큰 법이 바로 나와 함께 엔진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내연기관의 연소실 중앙부는 최고 3,000℃에 달한다고 일본 열역학자 (伊庭敏昭)는 저서에 기술하고 있다. 그 고온가스와 실린더 내벽 사이에 경계층이 있어서 가장자리에 도달하는 온도는 수백℃ 정도로 떨어진다고 한다.
- 기자명 천태봉
- 입력 2012.02.29 13:48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