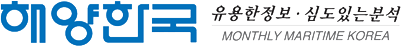기자생활을 하다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그 많은 사람들은 분명 다른 색을 가지고 있게 마련이지만, 사회인으로서의 규범을 지켜나가는 것으로 융화된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유독 개인의 색이 도드라지는 경우를 접할 때가 있다. 10월호를 준비하면서 ‘임기응변의 달인’을 만나게 된 것.
국내 유수 물류사들을 대상으로 ‘대중국 활약상’에 대한 기획취재를 진행했다. 세계의 제조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서의 국내 물류기업들의 대중국 활동은 그야말로 귀감이 될만하고 자랑할 만한 소재이기에 여느 기업들은 적극적인 협조를 보내왔다. 이번 기획은 특히 월초에 잡힌 덕(?)에 시간을 두고 업계에 자료요청을 할 수 있어서 그리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었다.
'H'사의 홍보담당자를 찾은 것은 여느 기업들보다도 가장 앞서서다. “워낙 여유롭게 요청하셔서 기한을 넘겨서 드릴 수도 없겠네요”했던 H사의 홍보 과장. 하지만 약속했던 날짜를 넘기고도, 이후 세~네번 더 연락을 취했는데도 그저 “보내 드리겠습니다”로 일관하고는 깜깜 무소식. 더욱 실망스러웠던 것은 전문지 기자 출신으로 매체의 특성과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이라는 점과 그럼에도 불구하도 단 한마디의 양해도 없었다는 점이다.
회사의 내부 사정이야 기자들이 알 수 없는 영역. 하지만 회사의 홍보실이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지원*협조하는 곳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기자들의 합당한 취재요청은 응당 그들 업무의 중요한 일부일 것.
기자들이 요구하는 취재요청에 하나같이 흔쾌히 협조할 수 없는 것이 담당자들의 한계 내지는 일의 애환이겠지만 깜깜 무소식으로 일관하는 모습은 회사 전체의 이미지를 담당하는 직책 있는 직원으로서의 행동에는 부적절해 보였고, 되레 그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
잘못된 친구에게서도 배울 것이 있다는 옛말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게 된다. 이와 같은 경우가 또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