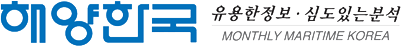공정거래위원회가 항만하역사 진입규제에 대해 칼을 뽑았다. 소규모 하역사들도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등록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등록기준인 ‘총 시설평가액의 2/3 이상, 최저시설평가액의 2/3 이상을 소유해야한다’는 법안을 삭제해 하역사간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의도이다.
사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운항만업계에 손을 뻗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9년 공정위는 ‘대량화주 해운업 진출규제’와 ‘도선업 개방’을 추진해 가뜩이나 침체되어있던 해운시장에 상당한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대량화물화주가 지배하는 해운업 등록기준인 30%을 철폐하고, 도선사의 응시자격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던 것. 해운업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유시장경제’의 논리로만 밀어부쳤던 공정위의 요구는 결국 이뤄지지 않은채, 대량화주 해운업 진출 지분이 40%로 부분 완화되고 도선제도는 유지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번 항만하역사 진입규제 철폐 역시 공정위의 ‘막무개내식 밀어붙이기’라는 것이 업계와 관련부처*연구기관의 공통된 의견이다. 하역산업에 대한 이해와 국내 하역사 상황에 대한 이해 없이 오직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맹신과 ‘성과주의’로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것.
1월 12일 국토해양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실무진이 만난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공정위 관계자가 국내 하역업의 현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며, “국내 하역사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나서야 심각성을 약간이나마 인식한 듯 하다”고 토로했다. 심지어 용역을 진행한 모 대학 교수도 동 법안철폐를 반대했는데, 공정위에서 무리하게 진행시켰다는 후문이다.
공정위가 원하는 ‘공정거래’는 이론적으로는 ‘선(善)’한 덕목일 수 있다. 그러나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거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선 시장의 안정화와 성숙화가 우선시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은 불안정한 하역시장에서 공정위가 원하는 ‘공정거래’는 오히려 독(毒)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