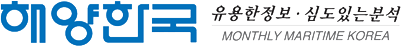선원가족의 삶을 다룬 수필 ‘창도(蒼濤)로 신인상

김동규 편집장에게 신인상을 안겨준 당선작은 <창도(蒼濤>. 창도는 ‘푸른 파도’ 또는 ‘넓푸른 바다’를 의미로, 어느 선장 부인으로부터 부쳐온 신년휘호이다. 그는 이 작품에서 남편 부재(不在)의 선원가족이 겪는 애환과 무변광대의 양상(洋上)에서 항해하는 남편의 안전항해와 무사귀환을 기원하며 붓글씨를 쓰다 서예가(書藝家)가 된, 어느 선장 부인의 삶과 일화를 다뤄 주제를 펼치는 솜씨가 뛰어나다는 평을 받았다.
그는 목포해양대학교를 졸업하고 해외취업선 1등 항해사를 지낸 해기사 출신으로서 1987년 배에서 내린 이후 해운전문 기자생활을 거쳐 한국해기사협회 편집장으로 재직 중이다. 그는 20대 초급 해기사 시절인 1982년 이미 ‘해군 진중문예’ 시(詩)부문에 입선했으며, 1985년에는 ‘해양문예’ 논픽션 부문에서 당선하는 등 문인으로서의 재능을 발휘해왔다. 그러나 이번에 비로소 정식 등단한 것이어서 늦깍이 문인인 셈이다.
1958년 경남 남지 출생인 그는 목포해양대학 항해과 26기이며, 방송대학 국어국문학과와 동아대학 언론홍보대학원을 졸업한 언론학 석사이기도 하다. 현재 김동규씨는 월간 ‘해기’지의 편집장을 역임하면서 한국해양문학가협회 홍보이사와 ‘해양과 문학’의 편집위원을 맡고 있다.
창 도(蒼濤)
묵은해가 어김없이 저물어 간다. 너도나도 굳은 언약이라도 한 듯 한 해가 가고 오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해가 바뀌는 데 대해 어느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거나 저항하지 않는다.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회귀어(回歸魚)처럼 만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 섭리를 거역하고 버티는 일이 생긴다면 어떨까 공연한 상상을 해 본다.
세밑에는 ‘해’에 대한 의미가 각별하다. 그러나 사람들이 제각기 의미를 부여하는 마지막 해넘이와 첫 해돋이, 그 자연현상은 세상 어디에나 같으리라. 백두산이거나 에베레스트 山이건, 극지방이거나 무변광대(無邊廣大)의 양상(洋上)에서나 한 해가 저물고 새 해가 밝는 것은 같은 이치가 아닌가. 그래도 세모(歲暮)의 일출몰은 아무래도 바다에서의 광경이 제격이리라. 그것도 대양 상이라면 금상첨화라 할 만하다.
이즈음 연하장과 신년 메시지가 물결을 이룬다. 어쩔 땐 참 겉치레같고 속깊은 정(情)이 없이 치르는 연례행사 같다. 그래도 연하장의 진정한 의미를 찾자면 순기능이 없는 것도 아니다. 나는 이래 저래 근무처에서 제공하는 양만으로도 충분히 송구영신 유의 덕담 인사를 전하곤 한다.
연하장을 개봉할 땐 늘 가슴이 설렌다. 무슨 내용, 어떤 인사가 담겨 있을까 호기심이 인다. 먼바다나 이국(異國)에서 보내온 경우는 더 그렇다. 내가 일하는 해양단체 기관지 편집실에도 선원가족이나 해기사들로부터 송년메시지가 더러 답지한다. 코발트색 짙푸른 바다 풍물이 물씬 나는 피봉을 하고. 일본에서 부쳤을까, 미국에서 부쳤을까, 정성도 지극하여라. 잠시 나도 모르게 푸른 바다 속으로 끌리어 간다.
언젠가 ‘바다가 푸르다는 것은 거짓말이다’라고 웅변한 작가가 있었다. 그는 진리 같은 이 역설을 아예 책 제목으로 하여 출간하기도 했다. 남도의 어느 갯가에서 나서 유년기를 보내고 문학을 공부하여 교사가 되고 일찍이 소설가가 된 그는 자신이 나고 자란 바닷가 이야기를 담은 작품을 많이도 발표했다. 그런데 바다가 푸르다는 것이 참이 아니라면 무엇인가. 뱃사람의 눈이든 작가의 눈이든 바다가 어떤 빛으로 보인다고 해서 문제삼을 일인가. 바다가 붉게 보이면 어떻고 파랗거나 하얗게 보이면 또 어떤가. 푸른 바다를 굳이 다른 색으로 보려고 한 과학적인 접근이랄까 심미안이 작용했을 뿐이다.
창도(蒼濤). 굳이 직역하면 ‘푸른 파도’이거나 ‘넓푸른 바다’라는 의미일 게다. 일필휘지(一筆揮之) 붓글씨로 쓰여진, 행초서에 가까운 힘있는 글씨다. 글씨 속 파도가 춤을 추듯 휘날리는 격랑의 바다다. 어느 선장의 부인으로부터 부쳐온 신년휘호이다.
선장 부인 H 씨와 나는 필자와 편집자로서 만났다. H 씨는 선원 아내의 이야기를 가끔 투고해 왔고, 나는 뭍과 바다를 오가는 애절한 가족의 대화를 정성껏 지면에 반영하여 해풍에 실어 보냈다. 남편 C선장이 휴가로 귀국했을 때였다. 부부가 편집실에 방문하겠다고 해서 무척 반가웠고, 나는 필자와 실제 상봉하는 기쁨을 누렸다. 그 후 1년만에 주고받은 안부가 이번 연하인사였다. 나는 작품의 주인공, H 씨의 글씨를 보자마자 이건 내 혼자만 볼 것이 아니라 협회 기관지(機關誌)에 실어서 해기사와 해양가족 등 많은 독자들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참으로 남편 부재(不在)의 인고의 삶이었다. H 씨는 외항선 배를 타는 남편을 만나 짧지 않은 세월을 선원의 아내로서 신산(辛酸)한 삶을 견디어 왔단다. 신혼 초 남편이 배를 나가고 난 뒤 한두 주일은 지옥 같았다. 선원가족으로서 한동안 물먹은 솜처럼 지내다가 수호신처럼 만난 것이 붓글씨였다. 배나간 남편을 기다리며 잡념이 생길 틈이 없이 붓글씨를 쓰고 또 썼다. 남편을 기다리는 생활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훌쩍 흘렀다.
그에게 붓글씨는 이제 제2의 직업이 되었다. 처음 ‘기다림’의 해소방편에서 시작하여 취미로 발전하더니, 이제 주부의 역할 만큼 비중이 커졌다. 서예가로서 어느 정도 수준과 역량을 연마하고 나니 이제 문인화(文人畵)에 심취해 있다. 붓글씨를 하다 불현듯 바다 생각, 남편 모습이 떠오르면 난(蘭)을 치고 죽(竹)을 친단다. 남편이 그리워서, 안전항해를 기원하며, 쓰고 쓰다 파지(破紙)가 돼 버린 화선지만 자그마치 반톤 트럭 분량이다.
그녀는 그렇게 해서 오늘의 서화가가 되었다. 처음부터 서예가가 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자신도 모르게 세월이 흘러 붓글씨를 쓰는 사람이 되었을 뿐이다. 그동안 갈고 닦은 글씨 솜씨로 여러 미술대전에서 입상도 했다. 이제 웬만한 서예대회는 심사위원으로 활동할 정도로 명성을 얻었다. 드디어 일약 서화가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그녀는 불철주야 선원의 아내다.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간 남편을 생각하면 한 시도 마음놓을 새가 없는 것이 선원아내, 가족의 심정이다. 바람만 불어도 덜컹, 폭풍우가 쏟아지거나 배 사고 뉴스만 들어도 철렁하는게 선원가족의 심사 아니던가. 아마 H 씨가 쓴 ‘창도’는 어쩌면 항해하는 남편을 생각하는 가장 지극한 마음이 아닌가 한다. 어떠한 황파(荒波)와 고해(苦海)에도 굴하지 않고 예정된 항해를 완수해 달라는 소망같은 주문(呪文)이다. 매서운 파도와 살을 에는 북대서양의 풍랑을 만나더라도 격랑에 떠밀리지 말라는 최후통첩이다. 어쩌면 천변만화(千變萬化)의 대자연과 맞서 싸우는 ‘뱃사람의 기상(氣像)’을 담았는지 모른다. 蒼濤! 붓글씨를 보면 볼수록 가슴이 펴지고 에너지가 솟아난다.
바다에 나간 선장은 아내를 서화가로 만들었다. 험한 세파를 항해하는 고독한 남편이 강한 아내를 만들었다. 마치 험한 파도가 유능한 항해사를 만들 듯이. 해양한국의 최일선에 나간 남편을 기다리다 글을 쓰고 시를 쓰다 보니 시인이 되고 수필가가 된 이도 있다.
뭇사람들은 남의 일이라고 쉬이 말한다. 선원의 아내야말로 글을 쓰고 꽃을 가꾸고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선택받은 자리가 아닌가, 라고.
그러나 정작 그들은 천만의 말씀이다. 마음의 여유로 시를 쓰고 붓글을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로지 남편의 안전한 귀가를 기다리는 인고(忍苦)의 긴 시간을 메우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 해양가족은 어쩌면 누구보다 처절한 외로움과 기다림의 당사자들이다. 노심초사(勞心焦思), 그들이야말로 ‘기다림의 미학’의 진정한 주인공들이다. 바다와 뭍을 넘나드는 그들의 애끓은 노래는 물결처럼 한시도 멈추지 않는다.
그대, 차가운 파도와 맞서는 해양인의 노래를 듣는가? 그대, 바닷새도 살지않는 먼 심해의 바닷소리(海鳴)가 들리는가, 사막같이 황량한 파도밭을 이겨내고 무사귀환을 염원하는 망부가(望夫歌)를 듣는가.
창도의 바다는, 영원한 모성(母性)처럼 지금도 출렁인다. (20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