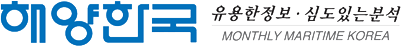천주교에서의 촛불 봉헌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
어둠이 깃든 곳, 그곳이 어디든 자신을 유감없이 살라 빛을 밝히는 한 자루의 초가 되고 재가 되어 세상 구원에 작은 보탬이 되고자하는 열정과 결단의 표시이다.
(밀)초는 원래 꿀벌들의 땀이 베인 벌집 등을 끓여 만든 희생의 산물인데다, 바로 그 몸까지 살라 불을 밝히는 어쩌면 비장하기까지 한 귀물이다. 그래서 초는 신성한 예식이나 특히 제사 때에 경건히 사용한다.
따라서 촛불봉헌은 결코 형식만이 아닌 자신의 불사름을 전제하는 의연한 몸짓이기에 숙연함이 깔려 있다.
2008년 6월 16일(월)자 한국일보에는 우리의 주식인 쌀과 쇠고기 그 중에 광우병 문제로 야기된 촛불집회서 ‘쇠고기 뒷전으로’라는 기사를 올렸다.
요지는 광우병 국민대책회의가 촛불집회의 성격을 반정부 집회로 규정하고, 진보단체의 가세로 반미적 이슈가 전면에 등장하면서 40여일 전 시민들을 집회로 이끌어낸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과 관련된 이슈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대북정책과 의료 민영화 등 비판의 場으로 변모하면서 한 시민단체는 “순수한 시민운동이었던 촛불집회가 진보단체나 각종 이익단체가 자신들의 주장을 펴는 장소로 변질됐다"며 “앞으로는 더 이상 집회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으로의 집회가 순수성보다는 정치색이 짙은 모양새를 가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배어 있다. 쇠고기 촛불집회의 시작은 정말 순수 했을까? 이 질문에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쌀과 쇠고기가 우리 민족에게 주는 의미를 먼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김일성이 살아생전 북한 동포들을 회유하기 위하여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있다. 그것은 “이밥에 고깃국을 실컷 먹게 해 주겠다”는 것이었다. 어쩌면 이 말은 단군 이래 가난한 우리민족의 소원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흰 쌀밥 같은 꽃이 핀다고 나무이름 조차도 이팝나무로 정했고, 고깃국도 귀하긴 마찬가지여서 겨우 삼복더위 때 복달임 음식으로 개장국을 먹었던 것을 보신탕이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불렀는지도 모른다.
아직도 우리 부모님들은 쌀농사를 지어 자식에게 보내는 것을 최대의 낙으로 여기고 계시고, 우리도 시골에 쌀농사 지을 논이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였다. 쌀만 있으면 끼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니까.
소는 항상 우리 곁에서 생활하며 겨울철에는 여물을 쑤어 주고 덕석을 덮어주며 가족처럼 지내다, 봄, 여름에는 밭갈이 논갈이로 농사일을 돕는다. 가을 추수에도 농사일을 도움은 물론 학자금이나 급전이 필요할 때는 어김없이 제 몫을 하는 가축이다.
그리고 마지막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먹거리로 생을 마감한다. 조선시대에도 쇠고기기 얼마나 우리 국민들에게 중요한 먹거리이었는가를 보여주는 예가 있다.
조선왕조실록 정조 38권, 17년(1793 계축) 9월 11일(신축)에 보면 대사간 임제원(林濟遠)이 상소를 하였는데 요점은 당시 조선의 쇠고기 소비가 생산을 크게 초과하여 심지어 농사지을 소마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원래 전통사회에서 소는 농사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수단이었으므로 조선전기부터 소 도살을 법으로 엄격히 금하고 있었다. 그래서 조선시대 소 도살은 법의 밖에 있던 백정들이 도맡아 했었다. 백정은 고려시대에 이어 조선시대에도 백성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 대신 의무도 없는 존재였다.
그래도 사람들이 쇠고기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 금(禁)하고, 처벌한다 해도 밀도살로 인한 문제는 태종과 세종 연간에도 끊임없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조정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하기에 이른다. 결국은 대세를 이기지 못하여 조선후기에 이르면 아예 사문화되어 유명무실해졌다고 한다.
박제가의 ‘북학의’에서 보면 전국 300여 관아 가운데 푸주간이 없는 곳이 없다고 했다. 성균관의 하례가 연 푸줏간에는 제사를 위해 허락을 받고 소 도살을 할 수 있었던 지위를 이용해 성균관의 공노비들이 심지어 밀도살까지 해서 고기를 내다 팔았다고 한다. 이를 포함 한양에만 24개의 푸주간이 있었다 한다.
그러한 분위기가 결국 흉년까지 더해지면서 향촌에서 농사지을 소까지 도살해 잡아먹는 지경에 이르러 사람이 쟁기를 지므로 농사를 망쳤다고 하는 것이 상소의 요지이다.
쇠고기 소비가 조선사회에 있어 얼마나 심각한 사회문제였으면 역대 군왕들조차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박제가 같은 이는 북학의를 통해 “소 좀 그만 먹고 중국을 본받아 돼지고기도 먹자”라고 할 정도였을까?
현대에 이르러 우리는 쌀밥과 고깃국을 먹는 것은 일상다반사가 되었고, 오히려 쌀의 편식으로 인한 폐해와 쇠고기의 과다 섭취로 인한 성인병을 걱정하는 세상이 되었다.
그런데 금년 들어 한미 FTA의 체결이라는 현실이 “칼로스의 쌀밥과 걸리면 죽는다는 광우병위험이 있는 쇠고기 국을 먹을 수 있다”라는 국민의 생존본능의 자극제가 되었다.
원래 민초들은 단순하고 본능적이다. 그래서 생존을 위협하는 것에는 본능적으로 대응한다. 왜 촛불집회가 힘없고 정치색이 없는 초, 중, 고 학생들로부터 시작 되었을까? 어른들은 그래도 선택의 폭이 있다. 말 그대로 안 먹거나, 먹고 싶으면 값비싼 한우를 사 먹으면 된다. 아니면 우스개 소리로 광우병은 잠복기간이 길으니 발병 한다 한들 살 만큼 산 사람은 큰 걱정이 안 된다. 그런데 학생들의 경우는 다르다.
앞으로 살아야 할 날도 창창하고 정상적으로 발육하여 튼튼한 성인이 되어야하는데 값싼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면 일반인은 그다지 환영하지 않아 결국은 학교 급식이 주된 소비처가 될 것이란 공포가 그들을 촛불 집회로 내 몬 것 같다.
백성이 국가에 세금을 내고 군주에게 충성하는 것은 그 국가가 군주가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준다는 믿음이 있을 때이다. 그 믿음을 저버리면 저항하게 되어 있다. 마치 외적이 침입한 것처럼... 가장 강력한 힘은 항상 바닥, 즉 민초들로부터 나온다. 민초는 가진 게 없어 잃을 것도 적기 때문이다.
촛불은 사십일 동안 살랐다. 성서에서도 중요한 일들이 사십 일을 한 단위로 진행된 경우가 많다.
노아의 홍수 사십 일, 열두 정탐꾼의 가나안 땅 사십 일 탐지, 모세가 시내산에 사십 일을 머물며 계명을 받은 일, 골리앗이 사십 일 동안 이스라엘을 조롱한 일, 엘리야가 사십 일을 걸어 호렙산에 이르러 하나님을 만난 일, 요나가 사십 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외친 일, 에스겔이 오른쪽으로 사십 일 누워 있었던 일, 예수님의 사십 일 금식기도 등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른 촛불은 자신의 불사름을 전제하는 의연한 몸짓에 숙연함이 깔려 있었다고 보여 진다.
그러니 이제는 촛불을 끄고 태양의 빛 아래서 냉철하게 국가의 대응을 지켜보는 것이 순서인 것 같다. 더 이상의 집회는 지금까지의 순수성을 훼손당하고 정치 논리에 휘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일국의 대통령이라도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지 아니한가? 그러면서 산술적인 접근을 한 다른 편의 생각도 들어보자.
지난 2006년 일본 <지속가능성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식품의 위해성에 대한 경제학'에 의하면, 이미 광우병이 발병한 일본에서 쇠고기를 먹고 인간 광우병에 감염될 확률은 48억8,400만분의 1이며,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인간 광우병에 감염될 확률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사람이 벼락을 맞을 확률이 160만분의 1이라고 하니까 광우병이 이미 발생한 일본에서 인간 광우병에 감염될 확률은 벼락 맞을 확률의 3,053분의 1이라는 이야기가 된다. 그리고 이동복 전 명지대교수의 조사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그 동안 발생한 광우병 발병 건수가 200건 미만, 흡연관련 질병 연간 사망자가 490만 명, 그리고 매년 교통사고 사망자 120만 명”이라고 했다.
산술적 접근방법으로 보면 광우병의 위험은 무의미하다. 그러나 다른 것도 있다. 다른 위험들이 공평하고 불가항력적이라면 FTA 체결로 인한 광우병위험은 우선은 한국 집중적이어서 불공평하고 인위적이다. 그리고 쇠고기에 대한 우리민족 고유의 문화와 정서는 모든 것에 우선하는 남다름이 그것이다.
그래도 더 이상은 과유불급(過猶不及)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