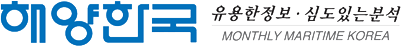(To own or not)

용선과 사선중 어느 쪽이 더 안전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호황기에 장기 용선한 선박은 침체기에 독약이 될 수 있지만 시장이 침체기에 진입하면 용선기간을 단타 형식으로 유지하며 용선과 반선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머스크라인의 경우 발주와 인수시기, 용선과 반선을 연계 운영하고 있다. 즉 인수 시기가 가까워지면 반선할 대상을 미리 선정해두고 배선항로를 조정하는가 하면 최근과 같은 장기 침체기에는 바닥용선료를 취하기 위해 용선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사례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다. 고율의 용선료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선사의 공통점은 호황기의 유혹에 이끌려 높은 요율로 장기 용선한 선박을 다수 운항하고 있는 선사들로 그 배경을 보면 주로 전문경영진이 주도하고 오너들이 추인하는 경우가 많았다.
UASC는 1976년 Bahrain, Iraq, Kuwait, Qatar, Saudi Arabia, UAE 등 중동 6개국이 공동투자로 설립한 회사였으나 몇해전 세계 최대 LNG 수출국인 Qatar가 대주주(51.3%)가 되었다. 6개국 공동소유 시절에는 주로 호황기에 발주와 용선이 집중되었던 반면 Qatar가 경영권을 지배한 이후에는 선단의 발주와 용선이 침체기에 이루어졌다. 공유 하에서의 리더십 부재와 전문경영인의 한계를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임기가 보장되지 않은 전문경영인 입장에서는 장사가 잘될 때 Boss로부터 돈쓰는 것을 허락받기가 쉽지만 침체기에 매입이나 신조 이야기를 꺼낼려면 대단한 용기가 없이는 엄두를 내지 못한다.
최근의 시장에서 보듯이 톱 3와 그리스 선주들의 발주는 2011년 이후 침체기에 집중되어 있는가 하면 고전을 하고 있는 선사들은 2007년 전후 호황의 막바지에 신조 혹은 용선이 집중되어 있어 허리가 휘청거리지만 경제선단으로 교체하려 해도 이제는 돈이 없다.
2008년 금융위기 직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선사들이 Bulk 호황이 2009년 중반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지만 10년 이상 호황이 계속될 것으로 기대한 사람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초 A사의 T/C선 155척 중 일부는 2019년까지 장기 T/C한 배도 있었는가 하면 건조중인 선박 56척에 대해서도 용선이 확정되어 있었다. 이른바 입도선매 현상이다. 용선선박 약 100척 이상이 적자인 상태에서 결국 60여개 선주사와 시도한 용선료 재협상이 실패하자 그해 1월 25일 법정관리를 신청하였고 자산처분, 채무변재, 차입 등은 물론 A사 자산상대 소송도 금지되었지만 결국 회사 문패가 바뀌는 아픔을 감내해야 했다.
2011년 1월 A사 사태에 이어 그해 8월에 세계 최대 Drybulk사인 Cosco가 해외 선주들에게 용선료의 재협상을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용선료 지불을 중단한다, 2008년도에 Capesize를 $87,000/일로 장기용선했는데, 2011년 8월 당시 요율이 $8,000 정도였으니 그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 결국 Cosco의 재협상 압박에 대해 Dryship, Navios Group 등 일부 선주들이 Cosco 선박의 압류로 맞섰지만, 대부분 재협상에 응할 수 밖에 없었고 역시 국영 HNA그룹 소속의 Grand China Logistic가 그해 11월 제 2의 용선료 파동을 일으킨다.
외신들은 주주의 이익이 자신들의 최우선 과제임을 재협상의 명분으로 내세우며 현재의 난관을 업계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한다고 강변했던 Cosco의 조치에 대해 Desperation(자포자기), Audacity(뻔뻔함)와 Hubris(오만)를 나타낸 행동이라고 거친 비판을 쏟아냈지만 벼랑끝 전술로 중국선사는 연명에 성공했고 A사는 법정으로 갔다.
지금 시장은 용선료 파동으로 시끄럽다.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계약요율대로 라면 존립이 흔들릴 지경이다 보니 생존을 위한 최우선 과제가 용선료 인하일 수밖에 없다. 계약대로라면 용선자들이 약자일 수 밖에 없지만 현실은 꼭 그런 것만도 아니다. 상대 선주도 실상을 잘 파악하고 있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상호 어떤 불편이 뒤따를 지를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용선자의 벼랑끝 전술이 먹혀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 전술은 1회 이상 기대하기 힘들다. Fool me once, shame on you ; fool me twice, shame on me! 라고 하지 않는가?
선주 입장에서 볼 때 해운의 원리는 쉬운 것이다. 누구나 잘 알고 있듯이 호황일 때 장기간으로 용선해주고 선가가 낮을 때 배를 구입하는 것이다. 도처에서 신조 억제, 해체 촉진 주장들이 나오고 있지만 벌써 시장에서는 지금이 신조와 중고선을 매입할 기회라며 행동에 나서는 선주들이 있다. 과거 해운사를 돌이켜 보면 현명한 선주는 시장의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멍청한 사람 아닌가 하고 의아해할 때 행동으로 옮긴다. 선박왕 Aristotle Onasis는 전쟁이 끝나자 다른 사람들은 곧 시장이 붕괴될 것이라고들 할 때 대량으로 Tanker를 건조하였고 마침내 시장은 세간에서 예측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전개되었다.
1차 용선료 파동이 Bulker 중심이었다면 최근의 2차 파동은 컨테이너선 위주다. 공통점은 파동의 주역은 아시아권이고 상대의 대다수는 유럽 선주들이다. 지구 한쪽에서는 금융의 문턱이 높아지고 조선소가 일감 찾기에 혈안이 되어있는 지금이야말로 선박을 확충할 절호의 기회라고 두둑한 포켓을 두드리고 있는가 하면 다른 쪽에서는 핵심자산의 처분까지 감수하며 벼량끝에서 처절한 사투를 벌이고 있다.
호황시 자금을 비축하였다가 침체기에 선대 교체와 보강을 하는 A군이 있는가 하면 호황기에 비싼 선가로 신조하고 장기용선을 늘리다가 불황기가 되면 싼값에 처분하는 B군이 있다. A와 B의 차이는 침체기에서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이 된다. 양측의 지배구조와 기업문화를 비교해보면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다. 한국은 어느 군에 속하는가. 사선과 용선의 이상적인 모델은 없다. 용선 비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는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시장을 보는 Boss의 안목과 결정적 시기를 포착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